참으로 자기 중심적이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 듯. 내가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이 (뭐 비슷한 건덕지가 하나 없어도) 다 내 이야기로 각색되어 메세지화 된다. (확증편향이니 인지부조화니 하는 것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네) 책 이야기지만 책의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적고 있더라. 하지만 이 책이 위안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처음 책을 펼친 순간 가슴이 답답했고 읽으면서 슬펐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며 짜잔하고 답답함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기대하게 되었다. 유리와 연우, 할아버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과거를 끊어 내지 않아도. 내일이 가뿐해지지 않아도. 따스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위안받았다.
서정희 씨에게 진짜 아기가 생겼다는 게 놀라웠고 두려웠다. 언젠가는 엄마 서정희 씨가 내 옆으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던 때였다. p.16
이마에 열이 올랐다. 대화 자체가 불편했다. 설명은 구차했다. p.51
마음이 힘들어도 시간은 칙칙폭폭 앞으로 나아갔다. 아침, 점심, 저녁이 지나면 밤이 왔고 또다시 하루가 시작됐다. 학교생활이 이어지고 친구를 만나고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겪다 보니 어느 틈에 나는 내 처지에 적응해 버렸다. 내 처지에 맞는 미래를 계획하게 됐고 상처를 덜 받는 방법을 터득했다. 가끔은 까닭 없이 울적해지고 암담한 느낌에 심장이 짓눌리는 기분이 되어 버리기도 했지만 우울해한다고 해서 바뀌는 조건도 아니었다. ... 어떻게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었다. ... 더 힘들겠지만 어쩌겠는가. 현실을 인정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을. pp.51-52
주방일이 피곤할 때면 일부러 그 기억을 소환하기도 했다. 언제 되새겨도 반짝이는 기억이었다. 할아버지의 잆에서 맛이 괜찮다는 말이 나왔을 때 내 안에 차올랐던 기쁨과 보람은 쓸쓸한 바다에서 만난 초록빛 작은 섬 같았다. 그날 나는 식사를 마치고 내 방으로 돌아와 소리 없이 웃었다. p.95
속에서 배신감과 분노와 절망, 좌절과 실망과 두려움, 미움, 슬픔 따위 온갖 거무튀튀한 감정들이 순식간에 똘똘 뭉쳤다. 뭉친 덩어리의 내부 압력을 상승시킨 것은 연우의 손톱이었다. ... 연우의 눈에 공포감이 서렸고 좀 전의 사나운 눈빛이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 모습이 마음에 착 감겼다. 기묘한 희열이 스쳐 지나갔고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갔다.p.130
손끝에 연우의 작은 몸이 닿았고 마음이 조금 더 풀어지는 것 같았다. p.135
"...이럴 때는 시스템을 믿는 수밖에 없다고." p.163
할아버지와 나 사이의 규칙대로라면 할아버지를 내버려 두는 게 맞았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거리를 두는 게 옳았다. 할아버지와 나 사이의 거리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했다. 어떤 상처도, 어떤 부대낌도, 어떤 위태로운 기대나 상처가 되고 말 애정도 할아버지와 내게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 집을 훌훌 떠나면 됐다. p.172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으면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네 할 일이나 잘하라는 말, 떠날때 되면 돈을 주겠다는 말, 호들갑 떨지 말라는 말, 내 눈물과 슬픔이 재수 없다는 말, 그 말들을 떠올렸다. 그 말들은 녹음된 것처럼 머릿속에 저장됐고 할아버지의 처지를 외면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할아버지에게 나는 억지로 떠맡은 아이였다. 정붙이지 않고 떼어 내겠다는 마음으로 나와 살아왔던 거였다. 나는 집중이 안 될 때마다 생각했다. 그래. 각자 사는 거야. 각자. p.179
막상 말은 꺼냈지만 엄마와 무슨 일로 싸웠는지 묻는 건 어려웠다. 어쩌면 세윤에게도 내가 내 사정을 감추는 것만큼이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도 몰랐다. 감추고 싶은 것은 감추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옳았다. 내 사정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고 세윤에게서 듣고 싶은 말만 쏙쏙 빼먹으려 드는 것도 염치없었다. p.186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있어. 나한테도 나쁜 일이 일어났지. 젊고 어렸을 때는......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 "그런데 갑자기 닥치더라. 준비할 새도 없이." p.206
"...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은 각각 다른 것 같더라. 감당해 낼 여건도 다르고. 설령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거야." p.207
어지러웠던 마음도 이틀이 지나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이런 마음이라면 엄마 아빠를 만나도 큰 사고 치지 않을 것 같았다. 엄마를 붙들고 오열하거나 같이 살자고 매달리지 않을 것 같았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나는 나대로 쭉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도 궁금한 건 꼭 물어보고 싶었다. ... 그 이유가 궁금했다. 아무리 한심한 이유라 하더라도 사실을 알고 싶었다. 그 이유가 초라하고 어이없더라도 거기에서부터 나는 시작하고 싶었다. 어차피 피핼 갈 수 없다면 마주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았다. 더 나빠질 일 따위는 없을 것 같았다. 기껏해야 내 존재가 조금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정도일 테고 그 정도라면 어렵잖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pp.212-213
... 서정희 씨의 마음을 생각했다. 서정희 씨가 고마웠다. 없던 과거일 필요는 없었다. p.249
나를 입양한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는 엄마의 친아들과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억지로(?) 떠맡게 된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다. 자신의 상황도 힘겨운데 볼때마다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어린 남동생의 치닥거리까지. 현실은 유리에게 자꾸 이런 저런 돌을 던진다. 돌에 맞아 어질어질할 때도 있고, 용케 피했지만 그 돌이 일으킨 파장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한다. 속상함 속에서도 연우가 누나에게 반말을 했던 순간. 할아버지와의 거리를 성큼성큼 걸어가 무너뜨리는 순간. 연우의 손을 잡고 안도감을 느끼는 순간. 등 따스한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 그 순간들이 소설 밖의 세상에 서 있는 내게도 위안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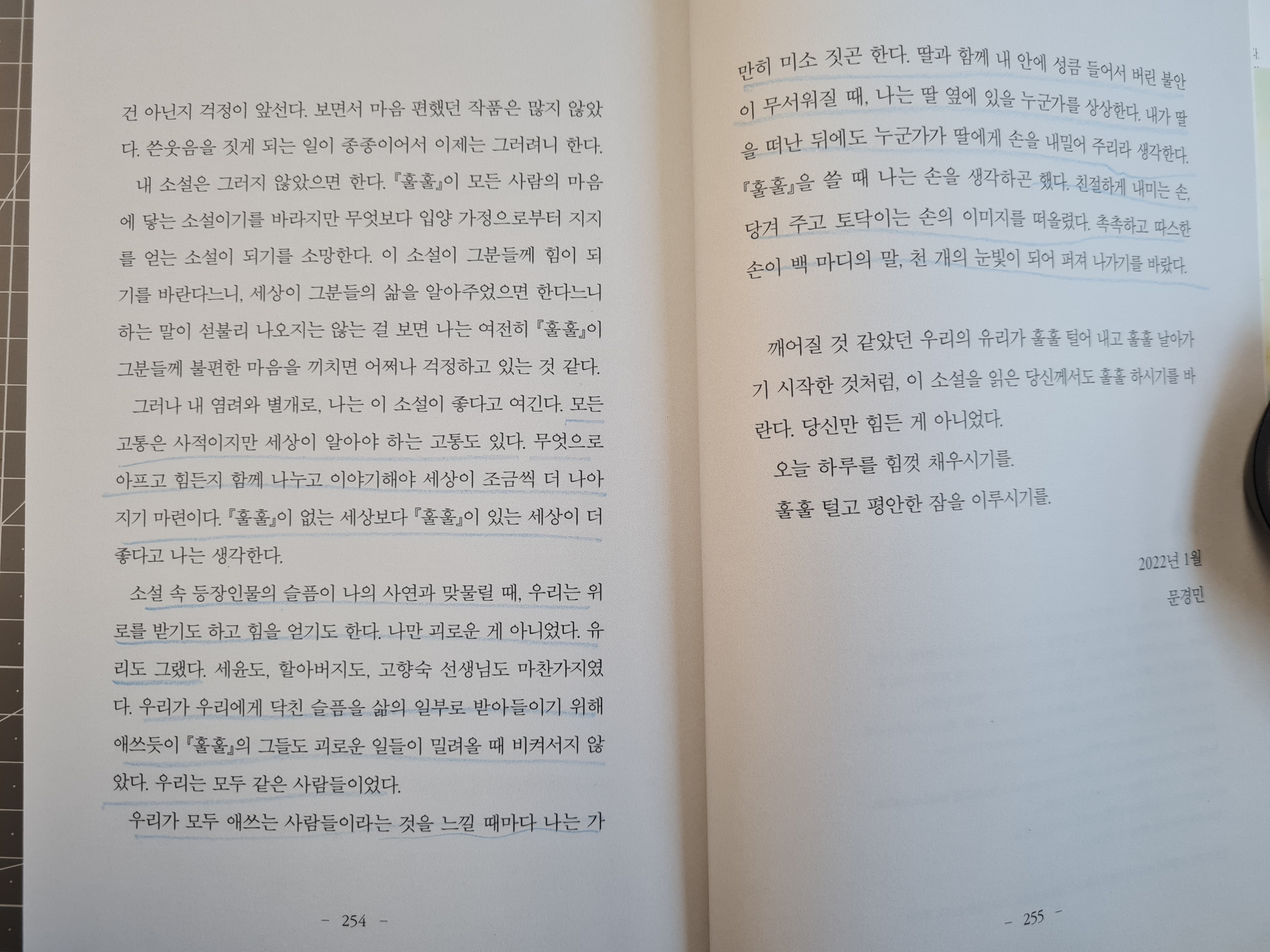
네게 소중한 것이 생겼다는 사실에 왜 나는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을까? 처음에는 내가 몰랐다는 것에 놀라고 그런 중요한 것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 속상했다. 그런 중요한 것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기에 속상했다. 속상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었을텐데 칭얼거리지 않고 화를 냈다. 두려움을 감추고 싶어 화를 내는 것으로 속상함을 표현했다. 찬찬히 생각해보니 그 때 이미 알고 있었다.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내가 너무 나답게 반응해서 시간이 단축된 것 뿐이다.
십수년 전의 나는 너무 무지했고 (지금도 나를 잘 모르지만 그 때의 나는 내 감정이 무엇인지도 무엇때문에 그러는지도 몰랐고 그걸 들여다볼 생각조차 안했으니 내 탓이다) 너무 오만해서 (내게도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데) 나를 너무 믿었다.
타인을 의심하고 경계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의심하고 경계했어야 했다.
내 감정과 생각을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나도 말하고 싶다. 없던 과거일 필요는 없다고, 고마웠다고.
'들려주고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게는 없고... 네게는 있는... (0) | 2022.04.16 |
|---|---|
| 보고싶음.질문. (0) | 2022.04.14 |
|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 (1) | 2022.03.18 |
| 있다. (0) | 2022.03.17 |
| 연결 (0) | 2022.02.28 |